밑에 선지원 후시험 제도에 관한 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씁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선지원 후시험제에 대한 글을 잠시 보고 나서 기억을 더듬어 써 봅니다.
1987년까지는 학력고사를 보고 나온 점수 320점 만점 + 체력장 20점 총 340 점 중 자신의 점수를 확인 한 후 중앙xx, 종로xx, 대성xx 등에서 발표한 배치표와 치열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위 눈치작전을 펼치며 대학교 원서를 접수했었습니다.
눈치작전이 워키토키, 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단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여기신 정부 고위당국자께서는 1988년 입시부터는 획기적인 대학입시 방법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선지원 후시험 제도이지요.
우선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정하여 원서를 접수한 후 그 학교에서 학력고사를 보고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력고사는 문과, 이과 로 나눠서 9과목을 봤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 87학번까지는 100% 객관식 시험이었는데, 불쌍한 88학번은 주관식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문과는 국어 1&2(75) , 수학 1(55), 영어(60), 국사(25) 윤리(25)(필수)
사회 1&2, 지리1&2, 세계사 중 2과목 (40)
물리1, 화학1, 생물1, 지구과학1 중 1과목 (20)
일본어, 불어, 독어 등 외국어 또는 상업, 공업, 농업, 가사 중 1과목 (20)
이과는 국어1(55), 수학 1&2(75), 영어(60), 국사(25), 윤리(25)(필수)
사회1, 지리1, 세계사 중 1과목(20)
물리 1&2, 화학 1&2, 생물1&2, 지구과학1&2 중 물리 또는 화학 중 1과목 선택 , 나머지중 1개 선택 (40)
일본어, 불어, 독어 등 외국어 또는 상업, 공업, 농업, 가사 중 1과목 (20)
총9과목을 봤네요. (괄호안은 배점입니다.) 국영수만 190점이라 국영수를 잘 하지 못하면 나머지 과목을 잘해도 좋은 학교 가긴 힘들었죠.
이때는 전기, 후기, 전문대 입시를 따로 봐서 전기대 학력고사 봐서 떨어지면 후기대 학력고사를 보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전문대 학력고사를 봤어야 했습니다.
날씨도 더럽게 추웠고, 떨어지고 나서 더 추위를 느꼈던 아픔이...
암튼 밑에 글에 생각나는 대로 사족을 함 달아봤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은 왜 자꾸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맑은생각님의 댓글의 댓글
해질무렵님의 댓글
내가 나올 점수를 미리 예상하고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였죠.
지금이라면 절대 불가능할 입시라도 생각해요.
junja91님의 댓글
나름 그 제도를 채택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던 것이, 그 이전에는 눈치 작전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온 집안 식구들이 총 동원되어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와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벼라별 일들이 다 이루어졌지요. 마감 시간이 지나 접수장 샷다를 내렸는데, 접수장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원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담벼락을 넘고 창문을 건너는 모습들이 테레비에 나오기도 했지요.
선지원 후시험이 채택되면서 그런 위태위태한 일들은 사라졌지만, 수험생들에게는 가능권 대학을 미리 점쳐야 한다는 부담, 시험 보기 위해서 학교로 가야 하니 지방에 사는 사람은 상경해서 여관방에서 마지막 수험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네요.
솔직히 자기가 겪은 입시가 쉬웠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세대의 짐을 지게 된다는 유시민 작가의 말씀이 새삼 연상되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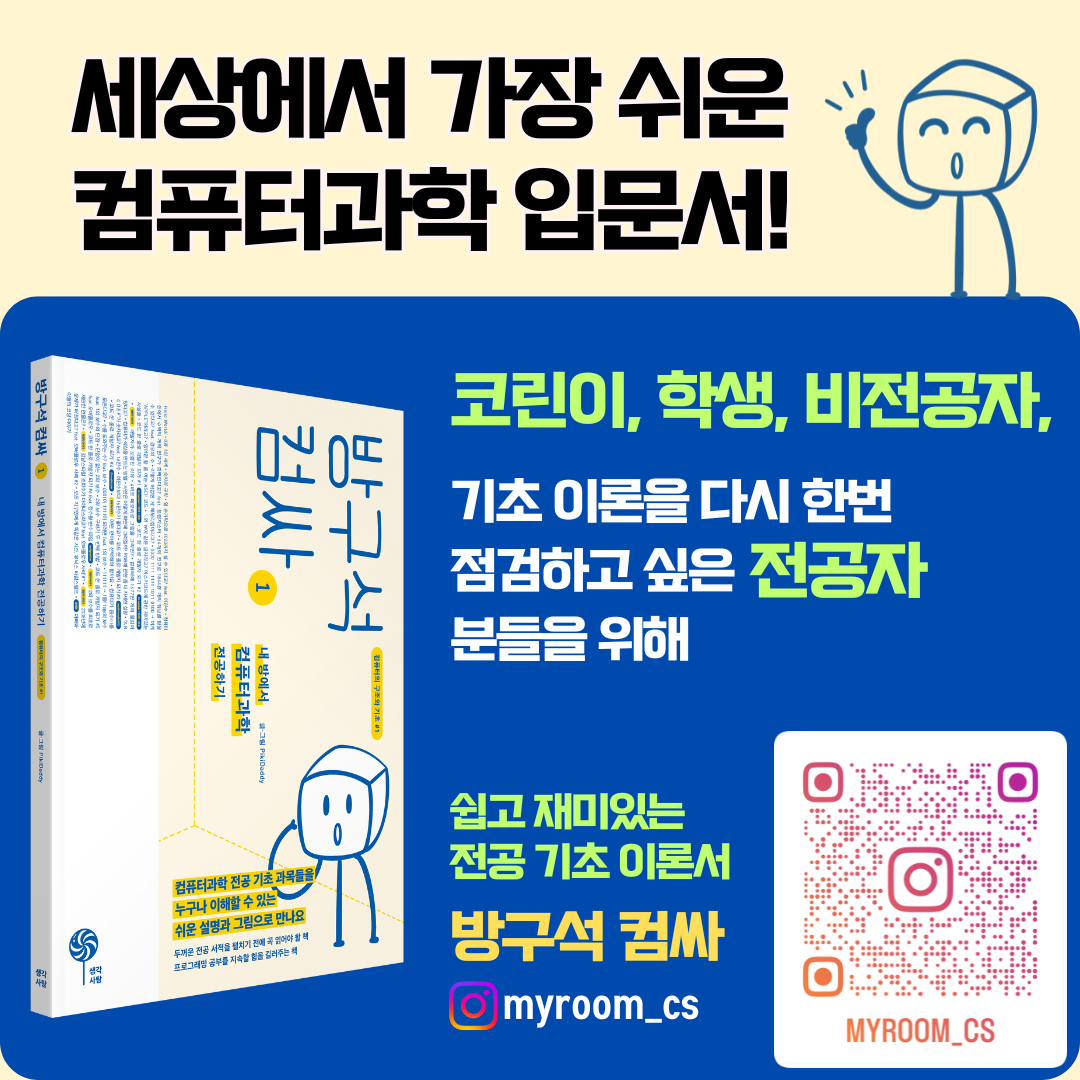














수나리지나리님의 댓글
반갑네요
이게 학교까지 가서 시험을 보니 먼곳이면 하루 먼저 가는 불편이 있었조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