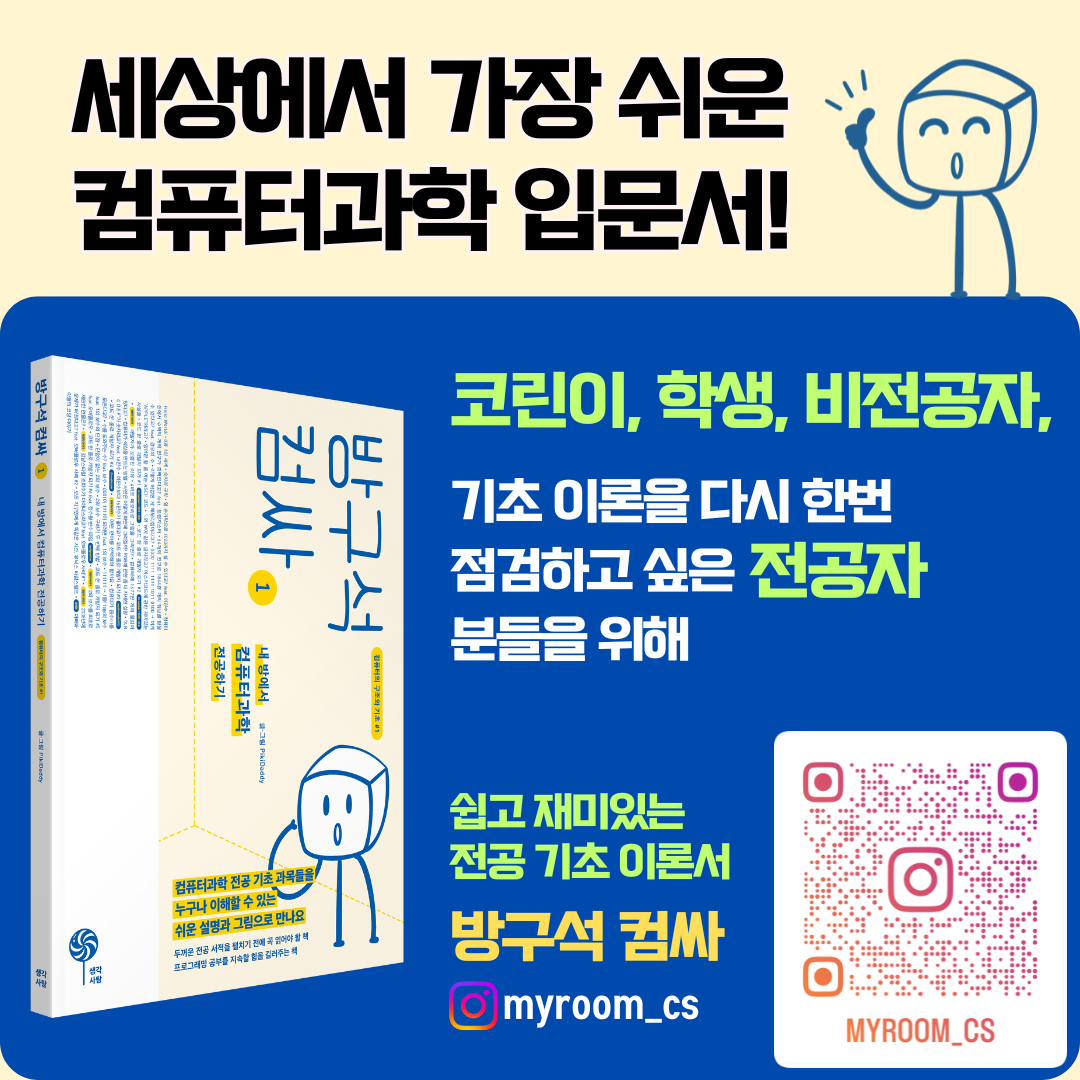[한페이지] 글을 쓰는 건.
페이지 정보
본문
글을 쓰는 건 허드렛일이다.
높은 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내야 하는 일,
그분의 일상을 한 장면도 놓이지 않고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화사(畫事)의 일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행여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그릇되게 적어놓은 게 발견된다면
그날은 날이 저물도록 곤장을 곤죽이 되도록 맞게 되는,
말 그대로 천한 일 중에 천하고, 고된 일 중에 고된 일이었다.
왜 글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왜 글을 배운다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의 목에 굴레를 씌운 것인지
참 부질없는 궁금증에 내 삶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기사(記事)라는 게 비록 천한 일이긴 하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이 고을에서도 손에 꼽히는 몇몇만이 할 수 있는 터라,
하루 일이 끝나는 늦은 저녁이 되면, 문밖으로 불러내는 이들이 많았다.
어딘가에서 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한눈에 보기에도 귀한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내 앞에 내밀고는 바닥에 쓰여 있는 글씨가 무엇인지 읽어달라는 이,
어렵게 얻은 자식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엽전 몇 냥으로 작명을 해달라는 이,
허리춤에 번쩍이는 칼날을 감추고 뭔지 알 수 없는 서신을 읽어달라는 매서운 이.
글을 안다는 것이 어느 날에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과 즐거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날에는 필시 이러다 내 목이 달아나지.. 라는 침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날 저녁, 문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 빼꼼히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그 여인의.. 아, 목소리, 목소리가 참 아름다웠다.
무슨 부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난 이미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다. 몸이 늦게 따라 나갔다.
"무.. 무슨 일이시오?"
"저.. 이것을 좀 보아주셔요."
그녀는 곱게 쌓인 비단을 풀고, 그 안에 적인 서신 한 통을 내게 내밀었다.
빼곡히 적혀 있는 글자들,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쓰여 있는 글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