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오늘의 한 단어 - 마지막
페이지 정보
본문
오른손 약지가 부드럽게 아래로 구부러지며 마침표 키를 눌렀다. 이 마침표가 마지막이다. 그는 5년간 주말을 포함해 매주 7번씩 써오던 칼럼에서 막 해방되었다. 물론 돈은 아쉽다. 몇 차례의 수상 경력은 있었다. 그러나 상은 상일 뿐 밥이 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주는 상이 강연으로 이어지고 그런 강연만 잘 이어가도 생활의 급한 불은 끄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기벽으로 치부되는 그의 낯가림에 있었다. 대면하면서 하는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타래가 엉켜가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낮가림'은 대외적 수사이고 실제는 혐오가 문제였다. 그런 그가 지난 5년간 외출을 하지 않고, 즉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밥이 바로 이 칼럼이었다. 하지만 방금 마침표를 끝으로 그는 칼럼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목구멍에 뭘 넘길 수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즐거웠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손가락들마저 춤을 출 기세다. 다소 즉흥적이긴 했지만 그는 이 마지막을 끝낸 뒤 가장 먼저 할 일이 정해 뒀었다.
작년 겨울, K 주간이 해외 여행 선물이라면 그에게 건넨 술이 있었다. 조니워커 블루 라벨 1리터. 우리나라의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 환자 중 하나인 그는 이 술을 받고 다소 난감해 했었다. 주간의 말마따나 가볍게 한두 잔을 즐기면 될 일이지만 그게 됐다면 '중독'이란 단어를 뇌리에 떠올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한 잔은 곧 1리터 병에 공기를 가득 담는 것으로 끝날 것임을 그는 확신했다. 그것은 곧 다음날 원고를 쓰지 못한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그래서 그는 그 호박색 유리병을 어루만지기만 하며 1년을 보냈던 것이다. 문장이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어떤 날에는 말 그대로 유리병을 핥고 있을 정도로 갈증이 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수해서 이 일이 끊기기라도 하면 ... 상상하기조차 싫었다.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런 if문은 통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문장이어야 했다.
마침표를 찍어버린, 마지막 강을 건너버린 지금에는 아무래도 좋았다. 글렌캐런에 담긴 호박색 조니워커, 그는 생각만 해도 경박하게 소리를 내며 미른 침이 목을 넘어갔다. 1/3 쯤 담긴 호박색 넥타르를 눈으로 즐기다가 가볍게 잔을 돌려가며 향을 모아 코로 흘린다. 그러고 나선 짧은 키스. 한 모금의 넥타르가 혀를 타고 입안으로 넓게 퍼질 것이다. 목을 넘어가기도 전에 숙성된 알코올이 구강 점막을 통해 그의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머금은 술은 혈관을 타고 심장을 거처 뇌에 도달할 것이다. 그의 뇌는 호박빛 물결에 여유롭게 출렁거리며 통주저음으로 반복되는 찬가를 부를 것이다. 그런 다음 차가운 생수로 입안을 헹구어 낼 것이다. 다음 한 모금을 위해 모든 것은 처음인 것처럼 준비되어야 할 테니.
그는 책장에 세워두었던 상자에서 조니워커 병을 꺼냈다. 받았을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영롱한 빛이 병 안에서 아롱거리고 있었다. 그는 코르크 뚜껑을 조심스럽게 잡아 당겼다.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조심이 행동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다. 보통은 병뚜껑을 덮는 비닐 정도는 일을 법했지만 귀여운 코르크 뚜껑을 보자 그게 무슨 상관일까 싶었다. 만약 있었다면 어쩌면 조바심에 실수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 마치 누군가 그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개봉해 둔 것 같은 병을 조심스레 다루면 첫 잔을 따랐다. 좁은 병입을 통해 흘러나오며 내는 소리마저 청량했다. 그는 이 첫 한 잔에 칼럼 1달분 고통이 녹아내릴 거라고 생각했다. 떨리는 손... 조바심 내지 말자를 다짐했지만 예상과 달리 위스키를 즐기는 여유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손이 거칠게 잔을 흔들다 손등으로 조금 흘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반 잔 넘게 찬 위스키를 단숨에 훅 들이켰다. 코끝을 부드럽게 울리는 위스키의 향과 부드러운 목넘김... 싸구려로는 느낄 수 없는 풍미였다. 그는 얼른 술이 흘렀던 손등을 빨았다. 준비해둔 생수병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글렌케런에 다음 잔을 따랐다. 이번에는 2/3 정도가 채워졌다. 그는 이렇게 밤을 보낼 것이다.
아침.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될 아침이 거실 통창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어제의 어둠은 방 중앙에서 구석으로 몰리다가 어느새 스러졌다. 방 안은 이제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듯했다. 이런 아침에, 그는 아직 어제의 행복에 빠져 있는 탓인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엎드려 누운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따라 옆으로 누운 글렌케런과 반쯤 남은 조니블랙 블루 병이 호박색 수면 위에 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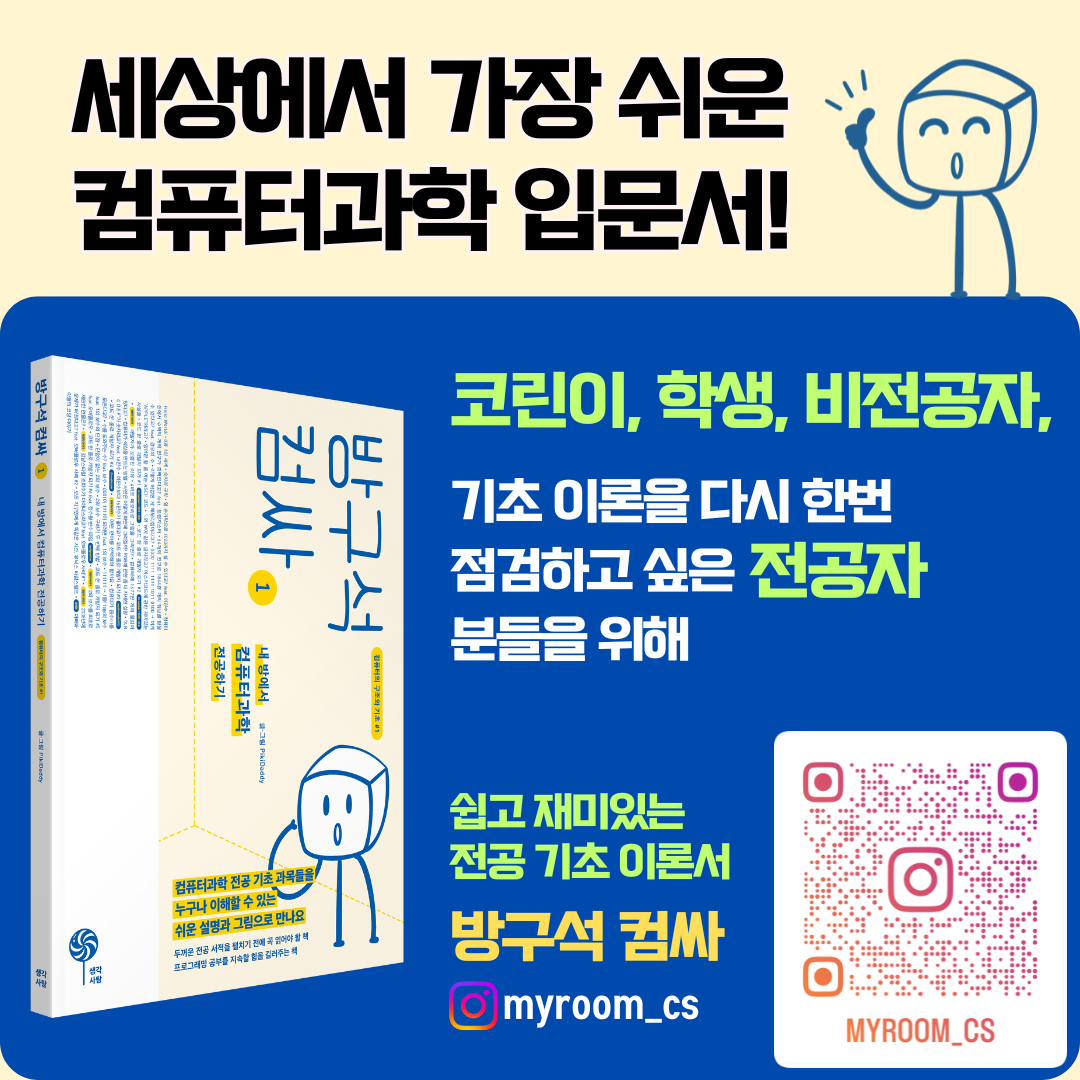



홍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