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오늘의 한 단어 - 성당
페이지 정보
본문
좀비가 갑자기 사람들을 습격하던 대혼란기 때에는 다들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사람들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
우리 동네만 해도 동네 초등학교에 모인 집단이 있고 주유소에 모인 집단, 파출소에 모인 집단, 그리고 나는 성당에 모인 집단에 속한다.
내가 살던 자취 집과 제일 가까운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벽이 튼튼하고 막을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적을 상대하기 쉽다.
그리고 첨탑을 이용해서 정찰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어때?”
김 씨 아저씨가 아래쪽 창문에서 물었다.
나는 망원경을 목에 걸고 첨탑 지붕에서 조심히 내려와서 창문으로 들어갔다.
“여전해요. 정문 쪽에 좀비들이 계속 서성거리고 있고 뒷문에는 숫자는 적지만 몇 마리가 듬성듬성 있어서 조용히 나가야 돼요.”
“이놈들이 사람 냄새를 맡는 건지 어떻게 출구 근처만 막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또 뚫고 가야죠.”
“그래야지. 먼저 내려가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내려와.”
“예.”
나는 몸이 작고 재빠르다는 이유로 이곳 첨탑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성당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신부님이나 신자 출신인 사람들이라 연령대가 높다.
그런데 여기 성당 무리에 합류한 이유는 성당 뒤편에 텃밭이 꽤 컸다.
평소에도 빨리 지나가려고 뒷문에서 앞문으로 가로질러 가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서 봤는데 텃밭이 크고 예전에 쓰던 우물터에 수동 펌프까지 있었다.
심심해서 되는지 펌프 손잡이를 올렸다가 내려봤는데 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안되는지 알고 가려는데 성당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던 김 씨 아저씨가 마중물을 넣어야 한다고 물 한 바가지를 부었다.
그리고 펌프를 움직였고 몇 번 손잡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콸콸 나왔다.
그 기억이 강렬했다.
그래서 좀비가 창궐해서 집에서 숨어지내다가 물이 떨어져 갈 때 제일 먼저 이곳을 떠 올린 것이다.
적어도 물이 없어서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몸을 천으로 묶고 옷을 그 위에 입고 마지막으로 눈에 작업용 고글을 착용하고 아래로 내려갔다.
신부님과 김 씨, 장 씨, 표 씨 아저씨에 영석 형이 기도하고 있었다.
신자가 아닌 나는 조용히 기다리다가 기도가 끝난 후에 신부님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 준비된 가방에는 텃밭에서 나온 채소들이 들어 있었다.
가방을 메고 입구에 만들어 놓은 무기고에서 쇠못을 박은 야구 배트와 부엌칼을 받아서 허리에 찼다.
이 성당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다.
무기를 들고 성당 안으로 들어 오지 말 것이 신부님의 요구였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만 무리에 들어왔다.
물론 몰래 과도 하나씩은 품고 있지만 그건 다들 모른 척했다.
오늘은 물건을 교환하는 날이다.
채소와 권총 몇 정을 파출소 집단과 교환하기로 했다.
기도에 안전을 당부하는 신부님의 긴 이야기가 끝나고 우린 뒷문으로 향했다.
김 씨 아저씨가 조용히 열쇠를 꺼냈고 우리는 무기를 들고 대기했다.
작은 소리도 좀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손짓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모두 준비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인 김 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다.
―끼릭!
살짝 열린 쇠문 사이로 내가 먼저 튀어 나가서 좀비 대가리에 배트를 날렸다.
퍼억!
나를 시작으로 우리 일행은 빠르게 문 앞의 좀비들을 처리했다.
손발이 척척 맞는 우리 별명은 성당기사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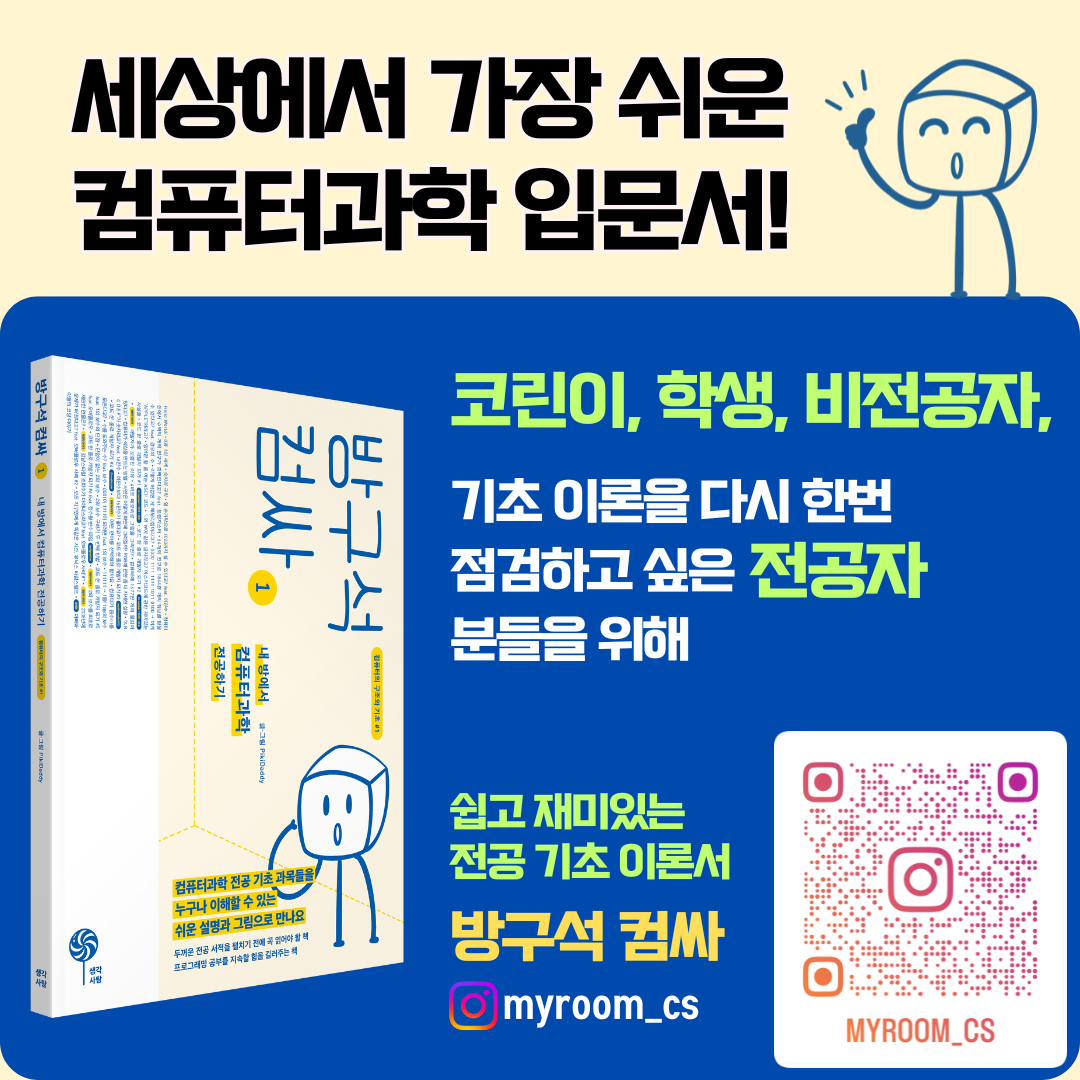



벗님님의 댓글
걸신들린 듯 살아 있는 사람의 육신을 뜯어먹으며
끊이지 않은 식욕만을 채우고자 껍질만 남은 짐승이다.
사람의 형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이 처음 덤벼들었을 때
주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좀비에게 뜯어먹히거나 좀비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그들 자신을 해해버린 것일 테지.
살아남은 이들에게 좀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기분 나쁜 냄새, 킁킁거리는 괴상한 습관,
괴상하게 꺾여버린 관절과 움직임.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성당기사단은 우리 아지트인 성당을 잘 지켜내고 있었다.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사람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어느 날, 잘 잠가놓은 성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씨 아저씨와 장 씨 아저씨가 그 소리를 듣고 서로를 쳐다봤다.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
다시 성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불규칙한 노크 소리.
두드린 것인가, 그저 의미 없이 부딪친 것인가?
"누.. 누구세요?"
어색하다. 좀비 세상에 누구인지 묻는 이런 말이 튀어나오다니.
다시 성당 문을 두드린다. 불규칙한 노크. 아직 규칙성을 띤 건가?
"당.. 당신.. 사람인가요?"
다시 성당 문을 두드린다. 신부님이 다가왔다.
문틈으로 바라본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하다. 시선이 떨린다. 충혈된 눈, 떨리는 시선.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하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잘 쓰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