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글쓰기] (12/11) 오늘의 한 단어 - 강둑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0:55
본문
* 아버지는 궁궐에서 쓰던 도자기를 굽던 관요의 사옹원이었다.
아버지께서 사옹원일땐 그렇저럭 살기 좋았다. 그녀가 살던 동네는 은근히 관요가 많았다.
그러다 왕이 남한산성에서 잡혀가실때에
광주에 살던 그녀도 잡혔다.
* 3년만이었다. 민회빈 강씨의 시중을 든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세손 마마의 은덕으로 밤새 스무 아흐레를 달려 강둑에 왔건만
시체들만 즐비했다.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건너는 족족 관군이 활을 쏘아 환향하는 우리를 죽였다.
* 강둑에서 그녀는 허탈한 마음에 아버지가 주신 품안의 칼을 뽑았다.
ㅡ 인조는 호란 이후 잡혀간 백성들이 귀국하는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환향하여 남하하는 백성들을 강둑에서 활을 쏘아 죽였습니다.
생명을 부지한 여인들은 몸을 더럽힌 '환향년' 이라는 옥쇄에 갖혀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에 '화냥년' 은 탬버린 치는 줄리 같은 년을 '화냥년' 이라고 합니다만...
암튼 왕이 개**였습니다.
어떤 **는 손바닥에 왕을 새기고 즐깁니다. 그**도 개**입니다.
댓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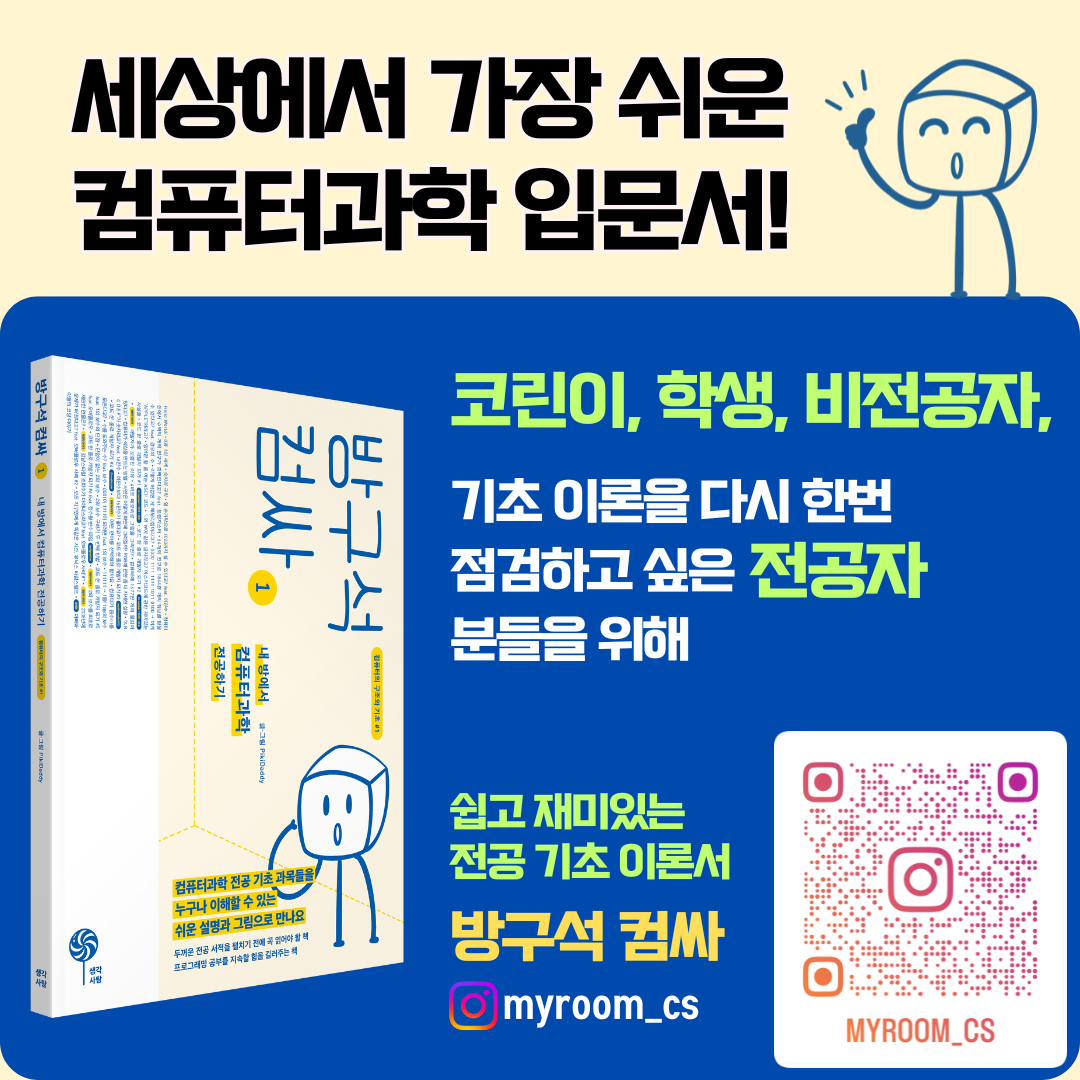





벗님님의 댓글
그녀는 칼을 쥔 손을 떨었다.
강둑에 선 그녀의 시야에는 물길을 따라 흐르는 핏물이 선명했다.
돌아가기 위해 달려온 스무 아흐레,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 밤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아렸다.
눈앞에 즐비한 시체들, 아무도 그녀를 맞이하지 않는 강 너머의 고국 땅.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어찌 내가 원해서 그리 된 것인가..."
허공에 던진 말은 흐린 강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달래려 하듯 내뱉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의 목을 조였다.
강둑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죽이며 몸을 낮춘 그녀와 동료들, 그들은 단지 백성이었을 뿐이다.
나라의 혼란 속에서 끌려가고, 굴욕 속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자들.
그들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활이 날아들어 생명을 빼앗겼다.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뜨거운 눈물이 고인 채로, 그녀는 땅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 아래 스친 흙은 차디찼다.
온기를 잃은 고국은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다.
목숨을 부지해 돌아온 것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활에 맞아 죽지 못한 죄,
죽음으로 그곳에 머물지 않은 죄,
나라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낙인찍힌 죄.
아버지가 남긴 칼을 더 꽉 쥐었다.
그것은 관요의 온기로 만들어진 칼이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담긴 이 칼이야말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조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 나라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기에, 그녀는 이렇게 부서졌고,
돌아온 곳은 그녀를 다시 죽이는 강둑이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라 했어야 했던가...
그리했다면, 나라의 죄인이 되지 않았겠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비참함이 아닌 분노였다.
나라가 정한 것은 법이 아니었다.
이름 없는 국법으로 그녀와 수많은 이들을 버렸다.
그들은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조국이 그들을 버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강바람을 느꼈다.
숨이 막힐 듯한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꺼지지 않은 불꽃을 품었다.
"버림받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 이곳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강둑은 적막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아우성치고 있었다.
잘 쓰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