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글쓰기] 오늘의 한 단어 - 낚시
페이지 정보
본문
‘어둡다.’
앞을 주시하는 눈은 뜨고 있어도 감은 것과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세상이 온통 새까맸다. 시각은 마비되고 오직 청각만이 내가 있는 곳이 물 위임을 알려주었다. 수상 좌대에 부딪히는 물결, 그마저도 잔잔해서 물위를 흐르는 바람 소리에 묻혔다.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내 한참 물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순간에도 지포 라이터를 챙기길 잘했다. 기름 타는 냄새를 풍기며 불길이 담배 끝에서 일렁였다. 필터가 침에 젖은 탓인지 담배가 잘 빨리지 않는다. 오랜 흡연으로 약해진 폐활량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뻑뻑 소리가 나게 빤 후에야 담배 끝이 새빨갛게 타들어 갔다. 아니 잠깐 밝았다가 어둠에 먹혀갔다.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담배 연기, 물 위의 검정엔 하양을 섞어도 암흑이 더욱 깊어진다.
‘무슨 소리지?’
단단한 고독에 미세한 금을 내는 소리, 노 젓는 소리다! 관리인에게는 분명 더 필요한 것이 없으니 내일까지 오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그런데 왜? 노 젓는 소리가 커지면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섞여 들렸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까지 낚시하러 오진 않는데 말이죠.”
“차가 막혀서 너무 늦게 도착했네요. 이 시간에 낚시를 할 수 있을까요?”
저 건너편 수상 좌대의 손님인 모양이다. 좌대에서 사람이 빠질 뿐 해 질 녘까지 다른 낚시꾼이 새로 덜어오지 않아 나흘째인 오늘에야말로 이 호수를 독점하리라 기대했다. 온전한 고독, 그걸 오늘 손에 넣을 줄 알았다.
“낚시야 하기 나름이죠. 대신 정숙을 잊지 마세요, 정숙.”
“정숙이는 또 누구예요? 참 구려, 호호”
이번엔 젊은 여자 목소리. 남녀 한 쌍이 왔나 보다.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 좌대에 남녀를 내려놓고 나룻배는 올 때보다 조용히 어둠 속으로 지워졌다. 공손하게 ‘정숙’을 지킨 건 나룻배뿐이었다. 그들은 부산을 떨며 좌대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여자의 새된 목소리를 어둠을 갈기갈기 찢고 다녔다.
“여기 벌레 좀 봐. 난 근처 호텔에 있겠다고 했잖아.”
“색다른 장소에 하는 것도 재밌겠다며, 물침대 어쩌고 할 땐 언제고.”
그들의 날카로운 대거리가 강물 위에 드리운 느슨한 낚시줄 같던 내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이정도 힘이면 송사리는 아닐 것이다.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줄은 위험하다. 물고기와의 신경전을 못 견디고 끊어지기라도 하면 낭패다. 그렇다고 조바심에 함부로 줄에 손을 댔다가는 손가락쯤은 쉽게 댕강 하는 수가 있었다. 신경줄도 마찬가지다. 다룰 땐 사시미 다루듯, 부드럽고 분명하게 방향, 갈 길만 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경험에서 배웠다. 뼈와 살 사이를 사시미는 그저 차갑게 지날 뿐이다.
애써 신경을 끊고 있는 사이 건너편 좌대에는 어느새 낚싯대 네댓 대가 무성의하게 벌여져 있었다. 낚시꾼은 없이 켜놓은 라디오만 무어라 혼자 지껄이고 있었다. 그러곤 불 켜진 수상 좌대는 강물 위에서 이색적인 파문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원시 시대를 깨버리는 증기의 피스톤, 그것이 만드는 문란한 파문일 것이다.
신호다. 낚싯대를 쥔 팔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짜르 전기가 흘렀다. 내일이면 좌대의 예약도 끝이다. 오늘밤에는 꼭 이루어야 할 일이었다. 조급해할 것 없다. 어제처럼 뼈는 뼈의 길로 사시미는 사시미의 길로 고요히 흘러가면 될 터다. 아이스박스 안, 잘 히야시된 사시미의 손잡이가 단단하다. 이걸 등 뒤에 꼽고 어제처럼 조용히 어둠이 흐르는 강을 가로질러 갈 것이다. 저 문란한 좌대, 그리고 곧 나는 다시 완전한 고독을 되찾을 것이다.
담뱃불이 가뭇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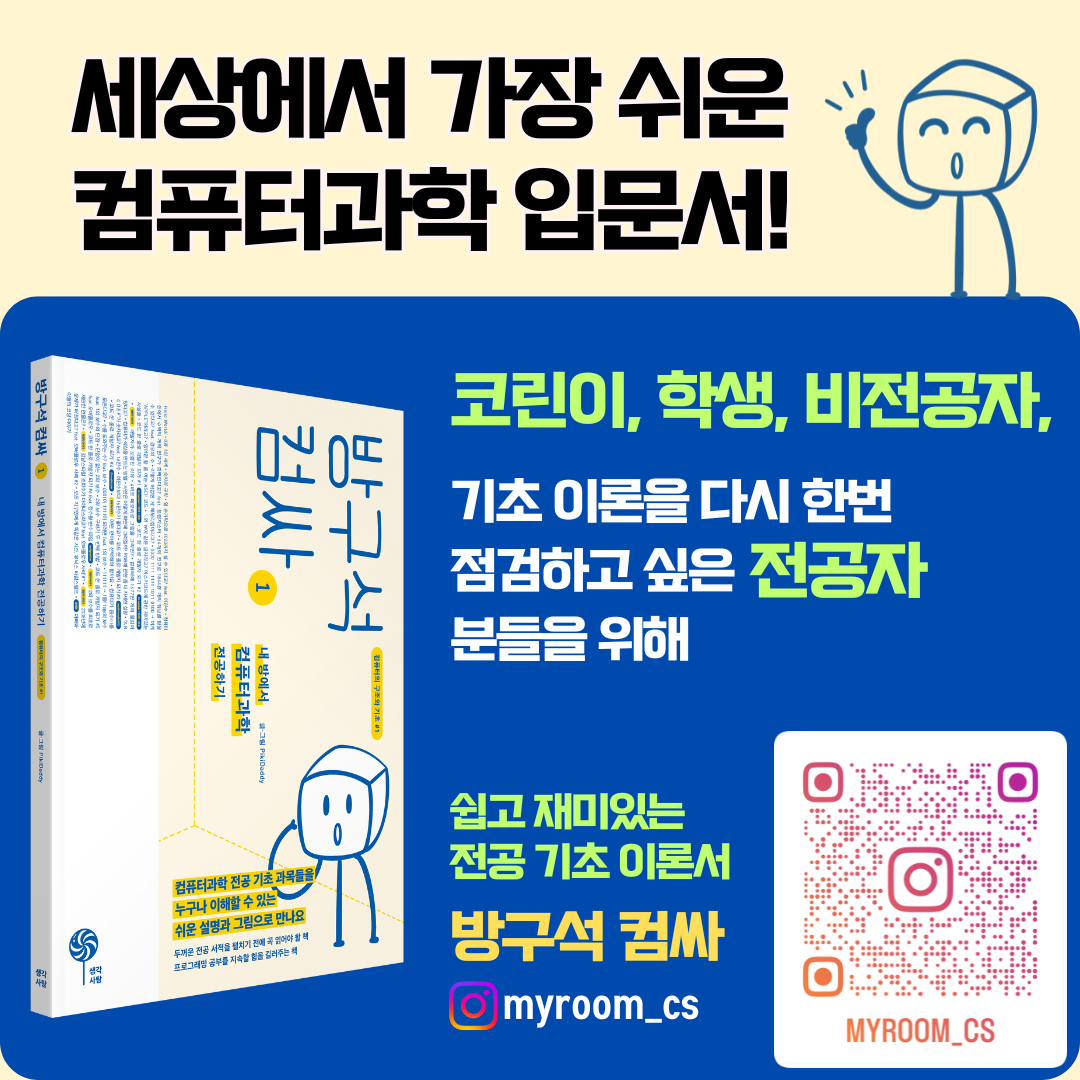



벗님님의 댓글
"어..? 으.. 으악!"
뭐, 뭐야? 시선이 흔들렸다. 낚싯대를 움켜진 손이 흔들린다. 놓이면 안된다, 놓이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명 저쪽 좌대에서 난 소리다. 무.. 무슨.
어둠이 짙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 것도 걸치지 않는 사내가 혼비백산하며 좌대에서 뛰쳐 나왔고,
곧이어 그의 여인이 밖으로 나왔다.
그 둘이 질러대는 소리에 정적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버렸다.
"사.. 살려줘ㅇ.."
그들의 좌대, 그들의 좌대가 호수 속으로 빨려들 듯 큰 파고를 일으키며 물 속으로 사라졌다.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거대한 머리가, 주둥이를 벌린 거대한 물고기 머리가 사라진 좌대 자리 위에서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물 속으로 사라졌다. 엄청난 높이의 물결을 일으켰고, 나는 순간 얼어 붙었다.
'저.. 저 넘을 잡아야겠다. 저, 저 넘을..'
잘 쓰셨습니다. ^^